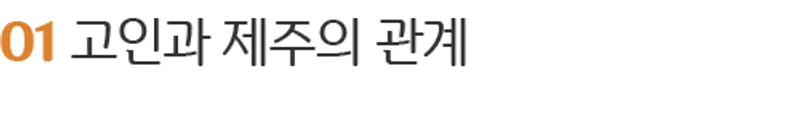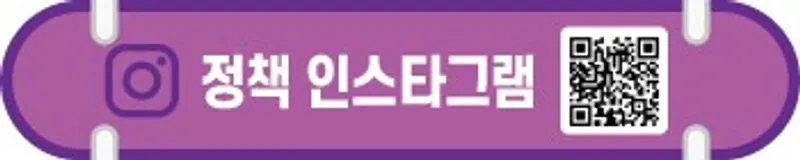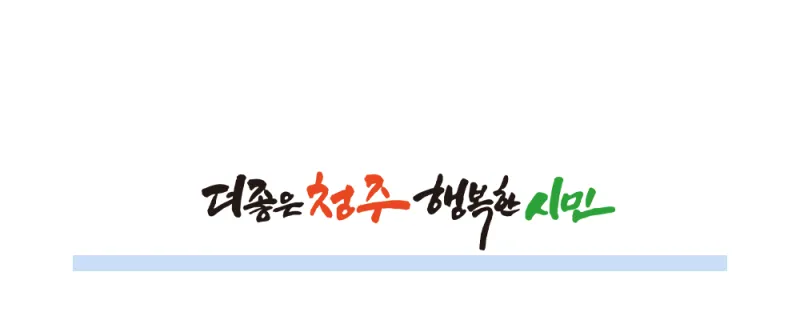2년 전
추석 차례상에 필수! 지방 쓰는 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대명절 추석
제사에 중요한 지방 쓰는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사당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습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씁니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씁니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씁니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씁니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씁니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씁니다.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사례에서는 ‘김해 김씨’)를 씁니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사례에서는 ‘길동’)을 씁니다.
차례상 차리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 #지방쓰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