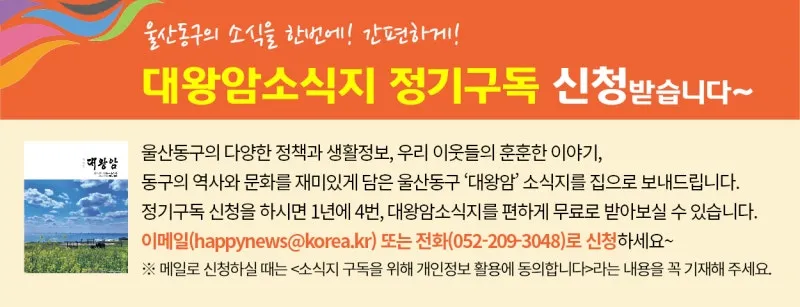7시간 전
옛 동구의 멸치 후리 조사 보고서 ② 해안별로 본 동구 멸치어장
글 장세동 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소장
동구 사람 대부분이 해방 후 일본 어민이 떠난 후 이들 어장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이종산과 성세륭처럼 일제강점기에 이미 일본 사람으로부터 어장을 구입해 운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후리어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은 후리어장이 너무 비싸 사기가 힘들었고 비록 산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일본인 위주로 되어 있어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여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인으로부터 후리어장을 구입해 운영했던 이종산과 성세륭은 동구 지역의 멸치어장 선각자였다고 볼 수 있다.
동구에는 크게 미포만과 전하만 그리고 일산만이 있었다. 그리고 동구와 북구의 경계인 주전에서도 멸치잡이가 행해졌다. 이외에도 현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 가까이 있었던 옛 쑥밭마을과 빈틈 마을에도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해안별로 본 동구 어장은 다음과 같다.
미포만 어장
미포만은 현대중공업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동구에서는 가장 멸치가 많이 잡혔고 따라서 가장 큰 멸치어장이 있었다.
미포만이 개발되기 전 녹수구미에서 가장 큰 멸치 어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김금수 였다.
김금수 어장은 전하마을 뒤편인 녹수구미 앞바다에 있었다. 김 씨 어장이 있었던 미포만은 해안이 2km나 되어 상당히 넓었는데 멸치를 잡을 때는 녹수에서 안미포까지 옮겨가면서 그물을 던져 잡았던, 동구에서 제일 큰 후리어장이었다. 김 씨가 멸치를 잡을 때는 인근 미포, 녹수, 명덕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해안으로 나와 그물을 당겼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들이 품으로 받은 싱싱한 멸치를 집으로 가져가 회를 만들어 먹곤 했다.
김금수는 돈도 많이 벌었는대, 당시 동구 사람들은 김 씨가 방어진에서 포경업을 해 부자가 되었던 백두선 다음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처럼 후리어장으로 번 돈으로 녹수구미 끝머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좋은 집을 짓고 살았다.
그 외에도 김 씨 어장 북쪽 바다에는 최정식 어장 등 규모가 작은 어장이 몇 더 있었다고 한다.
전하만 어장
북쪽 돌안산에서 남쪽 오자불까지 뻗어 있는 전하만에도 현대중공업이 들어서기 전까지 멸치어장이 여럿 있었다. 특히 전하만 남쪽에서 일산진 고늘산의 북쪽을 해안에 오자불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멸치어장이 여럿 있었다.
이곳에서 어장을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 성세륭이었고 오자불 연안 가운데는 서진화 후리막이 있었다. 또 전하마을 앞 다락방 연안에는 김유용의 후리어장이 만들어져 멸치잡이를 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쳤던 성세륭은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젊은 시절 보성학원 교사와 동아일보 기자를 지내는 등 각종 사회운동도 열심히 벌였다. 성 씨가 이곳에서 후리어장을 운영한 것은 부친 성수원이 후리막을 사서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동구에서는 김금수와 이종산에 이어 3번째로 큰 멸치 어장을 운영했던 성세륭은 이곳에서 어장을 하기 전에 주전의 보밑마을 후리개안에서도 어장을 사 운영하기도 했다.
일산만 어장
일산만에서 제일 큰 멸치어장을 했던 인물이 멸치잡이로 돈을 번 후 방어진 중학교을 설립했던 이종산이다.
이종산은 동구 남목에서 태어나 결혼과 함께 일산동으로 와 후리어장을 운영했다. 후리어장을 구입하기 전 일본인 아래에서 일했던 그가 어장 주인이 된 것은 일제 말이었다.
이종산 어장은 현 일산해수욕장 일대로, 규모가 상당히 커 계약할 때는 돈이 모자라 처가에서 돈을 빌려 계약금을 치러야 했다. 그런데 어장을 인수한 후 멸치 떼가 엄청나게 몰려온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 멸치가 많이 잡힐 때는 일산만 해안 뒤 언덕 전체에서 멸치를 널어놓고 말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서 있다.
이종산 후리어장의 중심지였던 곳에는 지금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 있다.
요즘도 울산사람이 이 씨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멸치를 잡아 번 돈으로 동구 학생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 씨 어장이 있는 곳에서 바다로 더 들어가면 오시케 어장이 있었다.
옛날에는 일산만 동북쪽 '동닥끝'을 오시케라고 불렀는데 이는 대부망(큰들그물)을 뜻하는 말이다. 오시케 어장은 대왕암공원 동북쪽 탕건바위 앞 바다 가운데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어장막사는 ‘돌안’에 있었다. 이 어장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경남 제1호 어장'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주전만 어장
옛 동구의 최북단 해안인 주전에서도 멸치후리가 성행했다. 이곳에서 해방 후 멸치후리장을 운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천경록이다.
주전에는 ‘후리개안’이라는 해안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에 후리막이 있었다. 멸치잡이 외에도 특정 어장을 정해 놓지 않고 멸치를 잡은 어민도 있다. 예로 미포 안마을에 살았던 김해룡은 배는 물론이고 멸치를 삶는 솥과 멸치를 보관하는 어막은 미포만에 두고 배 한 대로 불배멸치잡이를 하면서 미포만과 주전만은 물론이고 심지어 후리개안에서도 멸치잡이를 했다. 일반 어민들이 해안에서 멸치잡이를 한데 반해 김 씨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깊은 바다로 나아가 멸치를 잡았다. 그는 특히 이 해안에 있는 '헐미섬' 인근에서 멸치를 많이 잡았는데 때로는 주전의 맨 남쪽에 있는 보밑에서도 멸치를 잡기도 했다.
쑥밭 어장
쑥밭은 염포동 성내마을 남쪽해안 깊숙이 들어앉은 바닷가였는데 해안이 대부분 잔자갈로 이루어져 자갈 위에서 멸치후리 작업을 했다. 이 마을은 옛날에는 한문으로 쑥밭을 의미하는 '애전(艾田)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해안에는 바위가 많다보니 그물을 쳐서 멸치를 잡는 후리작업이 어려워 불배멸치잡이를 많이 했다.
멸치잡이는 1950년에서 70년대 미포조선이 들어올 때까지 성행했는데 당시 이곳에서 멸치잡이를 했던 사람으로는 김임호, 이재식, 이우식, 장영극이 있다. 이중 장영극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제12대 방어진 읍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곳은 특히 새우가 많이 잡혔는데 여름이면 해안에서 말리는 새우 때문에 항 전체가 붉은 색을 띠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해안에는 장생포 양죽으로 가는 돛배가 있었다. 나중에 이 마을에 미포조선이 들어서면서 홈개산을 허물어 바다를 메우고 공장을 지었다. 옛 홈개산 자리에는 현재 동구와 장생포를 잇는 울산대교의 높은 교각이 서 있다.
현재 이곳이 옛날 쑥밭이었다는 기억을 되살리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동구에서 울산대교로 들어가는 차량을 상대로 요금을 받는 톨게이트다. 이 톨게이트 이름이 쑥밭의 옛 이름인 '애전(艾田)'으로 되어 있다.
※ 2025년 대왐암소식지 여름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울산동구
- #대왕암소식지
- #동구문화원지역사연구소
- #장세동